이번 편의 부제를 담는다면
조약개정의 완성과 세계 정세
정도겠다.
어쩌면 조약개정보다는 제국주의 국가로 완성된 일본이 세계 정세에 점차 어떤 위치로 향해가는 지가 중요하겠다.
전편은 여기로
조약개정 4
조약개정 3조약개정 2조약개정 1이와쿠라 사절단대정봉환과 메이지 덴노의 즉위 사실은 당연히 외교관계가 설정된 모든 국가에 전달되어야 할 사항이었고,비교적 가까운 조선의 경우 금방 보낼
mtw31082.tistory.com
1910년(메이지43) 일본은 조선의 식민지화를 완성했고
청과 러시아를 꺾고 조선과 대만을 식민지로 둔 아시아 유일의 문명국이자 제국주의 국가로 그 위치를 공고히 했다.
그렇기에 이제 제국주의 국가다운 국제적인 대우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영일통상항해조약은 안세이 5개국 조약의 불평등성을 해소시킨 조약으로 대표되지만,
이 조약 및 이후 맺은 각종의 통상항해조약으로 해소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관세자주권이었다.
메이지 유신 직후부터 대장성이 외무성에 강조했던 그 경제적 불평등성의 해소가 아직도 지체되어 있었기에
한일합방의 완료에 맞추어 이는 새로운 일본의 외교 과제로 제기되었다.

1911년(메이지44) 일본과 영국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3차 영일동맹을 갱신해 10년을 연장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있어 영국이 다시 한번 일본의 이익을 위해 협상해주리라 일본은 믿었지만,
의외로 영국은 관세자주권의 회복이라는 주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행동했다.
영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한 일본에 접촉한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킨 그 나라
미국이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하워드 태프트로 외교적으로 동아시아의 중재자가 되어 열강의 대중국 침탈을 중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국내 영향력을 펼쳐 나가려한 상태였다.
그 일환으로 일본에 접근한 미국은 일본에 적극적인 태도로 관세자주권 회복에 호응했고,
1911년 미일통상항해조약의 폐기 및 신 미일통상항해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쌍무적 최혜국 대우로 인해 신 미일통상항해조약의 내용을 영국 역시 수용해야했고,
이어 각종의 통상항해조약은 개정되어 일본은 관세자주권 회복에 성공하였다.
일본의 외교적 역량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동시에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제국주의 열강으로 자리하는 데 어떠한 장애물로 가지지 않게 되었다.
메이지 시대 최대의 외교적 현안 조약개정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사실 외국인의 영대차지권 문제가 남아있었는데,
이는 1930년대 폐지되기 전까지 영대차지가 증가하지도 않고 추가적인 불평등성을 낳지 않았기에
이 신 미일통상항해조약을 조약개정의 마무리 및 완성 단계라고 말하곤 한다.
실제로 이 이후에 불평등조약의 개정이 추가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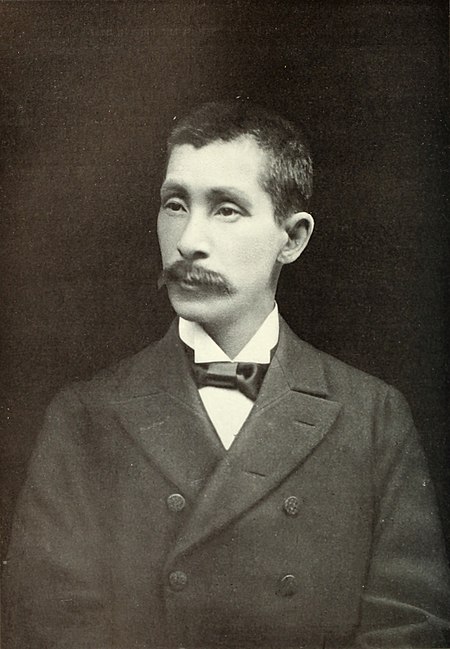
위 내용을 통해 1911년 영국과 미국이 각각의 이유로 일본에 접근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세계정세에 기인한 것이었다.
제1차 영일동맹의 체결과 세계정세
의화단 운동잠시 중국이야기를 해보자.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기독교 포교가 허용되었고, 해안의 조계지에는 서양인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아편의 폐해는 물론이고, 기독교 및 서양세력에
mtw31082.tistory.com
영국은 영불동맹과 영러협상을 통해 영-불-러 3개국으로 구성된 군사동맹을 체결했는데
이는 당시 독일의 팽창정책에 대한 견제를 위한 3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반면 독일은 독일-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이탈리아로 구성된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정확히 말하면 빌헬름 2세가 독러군사동맹조약의 연장을 거부하고 그 대신 이탈리아와 군사동맹을 맺은 것이었고,
점차 유럽은 영불러의 협상국과 독오이의 동맹국으로 정세가 양분되어갔다.
미국의 경우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부터 시작된 팽창주의 정책과 기존의 아메리카주의 정책에 있어
독일이 특히나 위협으로 파악되던 상태였다.
게다가 당시 자금면에서 미국은 영국, 프랑스와 밀접하게 얽혀있는 상태였기에
경제적으로도 영국과 프랑스의 적인 독일에 호의적일 수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이해관계는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였다.
독일과의 군사동맹이 독일에 의해 폐기된 이후 러시아에게 독일은 잠재적 적대국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따라서 러일전쟁 직전에 그랬듯,
만일 독일과의 전쟁이 개전될 경우 아시아와 중국 방면에서의 안전을 위해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일본에 호의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이었고
이것이 영일동맹의 갱신 및 범위 확대, 신 미일통상항해조약의 체결 등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러시아 역시도 러일협상 등, 러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독일이라고 하여 일본에 접근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빌헬름 2세는 외교에 소홀했고, 비스마르크는 이미 고인이었다.
그리고 그 사이 독일의 우방 일본은 이미 영국과 미국의 새로운 동맹국으로 변해있었다.
물론 독일의 시각에서도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확장주의 팽배했던 유럽정세의 분위기 악화가
동아시아 식민지로 확장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인 일본보다는, 덩치가 있는 이탈리아나 오스만 튀르크와의 관계가 더 중요했을지 모르겠다.
결과를 알고 있기에 비록 이러한 독일의 판단이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결과를 알고 있기에 이러한 독일의 판단이 얼마나 악수였는지 알 뿐이다.
'일본 근현대사 > 메이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메이지 덴노와 메이지 유신 (0) | 2025.01.28 |
|---|---|
| 한일합방 (0) | 2025.01.21 |
| 메이지 일본의 사회주의 3 (0) | 2025.01.21 |